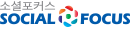“내가 김예지에게 ‘눈앞에 있는 걸 왜 못 보느냐?’라고 묻지 않듯, 그녀도 내게 ‘코를 간질이는 향기를 왜 못 맡느냐?’라고 묻지 않는다.”
이런 식의 만남,
‘나무’를 사랑하는 한 칼럼니스트가 있었다. 어느 날, 그는 나무이야기를 함께 나눌 피아니스트를 만났다. 그 피아니스트는 시각장애인이었다. 그리고 그 칼럼니스트는 자신이 사랑하는 나무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 나간다. 하루는 은행나무, 하루는 소나무, 하루는 꽃나무, 세상에 있는 수많은 나무들 이야기를 하자면 하루에 한 개씩 꼬박꼬박 이야기를 해도 아무 천 일 넘게는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나무’ 칼럼니스트라는 신기하는 직업을 가진 남자, 그리고 시각장애인이지만 누구보다 예민한 감각으로 음을 만들어내는 피아니스트, 이 책 <슈베르트와 나무(저자 고규홍)>는 나무에 대한 이야기이며, 동시에 보이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시각 장애인이지만 누구보다 따뜻한 오감을 가지고 있는 김예지씨의 피아노소리를 상상하며 이 책을 읽어 내려갔다.

나는 평소 나무를 좋아하는 편이다. 꽃이나 풀, 보리싹 같은 것도 좋아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을 꼽으라면 나무이다. 내가 그렇게 나무를 좋아하게 된 것은 어릴 적 놀러가곤 했던 시골 할머니댁 마을 어귀에 있는 한 연리지(連理枝)가 계기가 됐기 때문이다. 그 나무는 내가 아주 어릴 적에 만났을 때만해도 연리지가 아니었다. 당시에 나는 나무에 대한 깊은 지식이 없기에 연리지가 어떻게 생겨나는 지도 몰랐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어릴 적, 그 마을 어귀의 두 나무는 서로 다른 나무였다는 것이다.
기억을 더듬어 보니, 내가 어릴 때 그 나무가 병이 들어 속이 썩고 있었던 때가 있었다. 마을 어르신들께서는 “마을을 수호하는 나무이니 치료해야 한다”며 전문가를 불러 치료해 주려하셨다. 하지만 여의치 않았는지 나무는 점점 더 고목나무처럼 안이 썩어갔다. 그런 후 몇 해가 지났을까? 방학을 맞아 다시 할머니댁을 찾아갔는데, 문득 그 나무가 생각나서 찾아가봤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뿌리가 다른 두 나무가, 하나의 가지로 서로 붙어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두 나무는 속이 썩어버린 체로 한 가지를 서로 맞대고 살아가길 결정한 것 같았다.
그리고 그 상태로 지금까지 그 나무는 죽지 않고 매년 푸른 입을 틔운다. 나는 그때부터 나무를 다른 식물과는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 나무가 마치 살아서 서로 대화를 하는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봄마다 수정을 위해 꽃가루를 주고받는 것이나, 나무 가지를 맞대고 서로 그렇게 오랜 시간을 살아가는 것, 이런 것을 볼 때면, ‘아~ 이렇게 살아가는 구나’라고 느낀다.
살아있는 생명, 생물, 그렇다면 예지씨, 그녀가 말하는 ‘나무를 느끼는 방식’이 이런 느낌일지도 모른다. 나는 그동안 수많은 수목원이며, 공원, 꽃나무 축제 등을 가면서도 한 번도 그녀가 보는 방식으로 나무를 보려 한 적이 없었다. 수목원이나 산림욕장에 가면 단순히 ‘좋은 물질이 나와서 몸에 좋다’라고만 알고 있었지, 나무에 대한 신비로움은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나에게 나무는 그저 초록빛에 싱그럽고, 늘 그 자리에 있으니 굳건해 보이는 풍경에 지나지 않았다. 이런 나의 생각이 이 책을 통해, 나무 한 그루가 사실 모두 각자 다른 의미를 지닌 존재라는 것을 새삼 알아갔다.
“무언가를 실제로 만진다는 것은 그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나만의 방식으로 나무를 좋아하고, 또 느낀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다른 시선과 방식으로 나무를 보고 있는지를 깨닫게 된다.
나무 칼럼니스트 고규홍씨는 책에서도 말했듯 “나무에 대해 18년 동안 찾아보았으나 키우는 것은 여간 안 된다”고 했다. 그는 나무에 대해 글을 쓴다. 그런가하면 피아니스트 예지씨는 나무를 ‘냄새’와 ‘촉감’으로 느낀다. 두 사람은 줄곧 나무 이야기를 하는데, 그 대화를 보면 예지씨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나무를 느끼고 있었다.
우리가 길을 걸어가다가 가로수 나무 아래에 서서, ‘이 나무는 어떤 향기가 날까?’라고 생각해본 적이 있나? 나는 그녀가 나무를 느끼고, 듣는 방식을 읽으며 내가 보았던 수많은 나무들을 다시금 떠올려보게 되었다. 그녀가 말하는 나무가 내가 아는 그 나무가 맞는데도 왠지 처음 접해보는 나무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나무를 ‘변하지 않아 좋다’라고 늘 말하면서도 왜 그녀처럼 만지고, 냄새를 맡아보지는 않았던 걸까? 나와는 다른 시각장애인으로서의 시선, 그것은 매우 흥미로운 시선이었다. 그리고 그 시선을 따라 나는 그들이 말하는 나무를 하나씩 떠올리고, 찾아보며 함께 나무 여행을 하는 기분이 든다.
“내게 나무는 장애물이에요”
왜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예지씨는 시각장애 안내견인 ‘찬미’와 함께 밖을 나선다. 물론 찬미가 길에 놓인 장애물이나 횡단보도 등으로부터 예지씨를 보호해주기에 안전하다. 하지만 그런 찬미마저 막아줄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것은 길가의 ‘나뭇가지’이다. 흐트러진 나뭇가지, 우리는 살짝 머리를 숙이며 피해가면 그만이지만 그 나뭇가지는 시각장애인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장애물이 된다.
이렇듯 우리는 남의 시선을 간과하기 일쑤다. 비장애인이기 때문에 모를 수 있었다고 말하기에는 부끄러워지는 것들. 가늘고 별것 아닌 나뭇가지일 수도 있지만 그 나뭇가지가 시각장애인에게는 커다란 놀라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해줄 방안 역시 딱히 없다. 그 나뭇가지처럼 예지씨가 바라보는 세상과, 내가 바라보는 세상을 좀 더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바라보게 된다. 비단, 나무나 나뭇가지뿐이겠는가.
이 책은 ‘시각장애’라는 단편적인 면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아마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세상을 보는 시선과 거리가 상이한 부분은 수 많을 것이다. 우리는 그 차이를 어떻게 알아가고, 좀 더 이해의 폭을 넓힐까를 생각해야 한다. 비장애인과 장애인으로서 살아가는 사회, 장애라는 시선으로 세상을 다시한번 해석해 보면서 따뜻한 마음의 치유를 느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