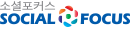"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나의 모습 보이길 꺼렸었지만, 루벤을 통해 사랑을 알았고 그에게 감사한다. 사랑이란 앞을 볼 수 없는 것과 같은 것”

‘트롤’은 북유럽 전설에 나오는 악마이다. 주로 거인이나 난쟁이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은데, 안데르센의 ‘눈의 여왕’ 속에도 트롤이 등장한다. 그 ‘트롤’에게는 거울이 하나 있었다. 아름다운 것을 비추면 아름다움이 사라지고, 추하고 쓸모없는 것을 비추면 더 흉하게 보이는 거울이었다.
세상은 이미 트롤의 거울가루로 자욱한지 모른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 눈동자 속에 거울 미립자들이 스몄는지도. 대다수 사람들은 불행하게도 눈으로만 세상을 볼 수 있다. 어쩌면 우리는 그런 이유로 겉 안에 있는 진짜를 못 보는 것은 아닌지.
많은 예술가들이 ‘눈의 여왕’을 작품 속 모티브로 삼는 경우가 많다. 이 영화 역시 그렇다. 곳곳에 눈과 겨울 이미지가 가득하다. 이런 그림에나 등장할 것 같은 공간 속 저택에서 그들의 이야기는 시작된다.

후천적으로 앞을 볼 수 없게 된 젊고 잘생긴 청년 루벤. 누구라도 이 청년을 본다면 반하고 말 것이다. 그는 앞을 볼 수 없다는 절망 속에서 몸부림친다. 루벤의 어머니는 그런 루벤을 위해 차분하게 책 읽어줄 사람을 구하는데 대부분 루벤을 견디지 못하고 그만두고 만다. 계속되는 루벤의 어둠 가운데로 한 여자가 온다.
하얀 머리, 창백한 피부, 흉터로 가득한 마리라는 여자. 사랑은 그렇게 우연히 온다. 난 한 번도 이들처럼 사랑한 적 없는 것 같다. 조금이라도 사랑이 올 것 같으면 겁 많은 토끼처럼 달아나 버렸다. 좀 무딘 사람이었더라면 좋았을 걸 그랬다.
마리의 얼굴과 몸은 유리에 긁힌 상처로 가득하다. 그 상처는 마음까지 긁혀서, 마리는 온몸을 가리는 옷을 입고 자신의 모습을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된다.
날카로운 것으로 학대당한 것보다 더 견딜 수 없었던 것은, 마리에게 예쁜 곳이라곤 한 곳도 없다는 어머니의 언어폭력. 말은 뿌리가 깊어서, 한 번 박힌 말들은 뽑아내기 어렵다.
지적이고 분위기 있는 목소리를 지닌 마리를 루벤은 아름다운 처녀일 것이라고 상상하게 된다. 마리 역시 자신의 외모와는 다르게 붉은 머리칼을 가진 스물 하나의 처녀라고 이야기 해버린다. 거짓말은 가끔 간절한 소망처럼 들릴 때가 있다. 이 장면처럼 말이다.

사람에게는 생물학적 나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나이가 있다고 우겨보고 싶다. 그 나이의 속도는 빠를 수도, 느릴 수도 있다고. 그렇게 가정할 때 둘은 비슷한 연령을 가졌고, 완벽하게 어울렸다. 빙판 위에서 함께 있는 모습은 이 세상의 또 다른 케이와 게르다처럼 보인다.
사물의 냄새를 맡고, 손으로 만져보며 감촉을 느끼는 눈이 아닌 마음으로 보는 법을 루벤은 깨닫는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에 비친 마리에게 항상 예쁘다고 말해준다. 심지어 마리 얼굴의 흉터조차 얼굴에 핀 얼음 꽃처럼 아름답다고 느낀다. 이 부분에서 내 마음이 얼마나 오래 머물렀는지 모른다. 그러나 마리는 자신의 얼굴이 오래된 고목 껍질처럼 거칠고 흉물스럽게 여겨진다. 눈으로 볼 때와 마음으로 볼 때의 차는 이렇게 커서 대조적이다.
사랑이 커지던 어느 날. 집안 주치의 빅토가 루벤의 시력이 수술로 회복될 수 있다는 소식을 전해주고 가는데, 그 말을 엿들은 마리의 공포감은 극에 달한다. 루벤이 세상을 보게 되는 것은 기뻤지만, 숨기고 싶은 자신의 모습을 루벤이 본다면 실망하며 떠날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을 것이다.
고민하던 마리는 루벤의 수술 날, 편지를 쓰고는 떠나 버린다. 버림받고 싶지 않아서 먼저 떠나는 심정. 얼음에 베인 것처럼 누르면 따갑고 오래 뜨거워지는 기분을 나도 맛본 적 있다. 그건 자신 없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행동이다.
"루벤.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보고 있겠지. 허나 가장 아름다운 것은 네 손끝으로 본 세상일거야. 나를 기억해줘. 네 손 끝, 네 귓가에 남은 나를..."

운명은 이들을 어디쯤 내려놓았을까. 루벤의 시력이 회복되고, 루벤은 세상에서 가장 보고 싶었던 마리를 찾아 오래 방황했다. 그리고 마리가 읽어주던 ‘눈의 여왕’을 읽으려고 들렀던 도서관에서 마리를 찾아낸다. 아마도 마리와 책은 서로 뗄 수 없는 것 이상이었는지도 모르겠다.
손의 감촉과 코에 남아있는 냄새, 아직 기억하고 있는 목소리로 마리를 찾아낼 때, 그리고 “나랑 집으로 가요”라 말할 때 이들을 보고있던 사람들은 모두 슬프고 설렜을 것이다. 하지만 마리는 사람의 시선과 세상을 보게 된 루벤의 눈이 두려워져서 “난 동화 같은 건 안 믿어”라는 말을 남기고 다시 떠나버린다.
마지막 장면을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난감하다. 루벤은 마리에게 가기 위해 마리를 더 잘 보기 위해 자신의 눈을 버렸다 정도로 말해야 할까.
루벤은 벤치에 앉아 다시 돌아오게 될 마리를 상상한다. 그의 표정은 분명 웃고 있다. 공기 속에서, 햇살 속에서 마리를 만나고 있는 것 같다. 붉은 마리도 하얀 마리도 루벤에게는 그저 마리일 뿐이다.
본다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는 어디까지 볼 수 있는지. 무엇을 보는 게 중요한지 생각하게 한다. 결국 보는 것은 한계가 있다. 앞으로는 자주 눈을 감아봐야겠다. 그동안 루벤처럼 온몸의 감각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보려고 애쓴 적이 없었다. 손끝으로 만지는 머리카락, 이마와 코는 어떤 촉감과 모습일까.
우리는 현실 속 소중한 마리를 알아차릴 수 있을까. 분명한 것은 눈으로 볼 때보다 눈이 아닌 것으로 볼 때 더 깊은 것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이다.